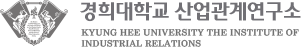[시론] 브랜드 기술로 한국건설이 사는 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7-24 08:56본문
건설이 분명 위기 상황인데 예상과 달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산업의 위기인지 시장의 위기인지 불분명하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경예산 편성 신호가 나오자 건설 투자에 최소 3조원 이상을 주장했다. 실제 편성은 2.7조원에 그쳤지만 의외로 협ㆍ단체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추경예산 3조원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주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한다. 기존 예산은 신규 착공보다 상당액이 높아진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데 사용되고 추경예산 역시 부동산 PF 지원에 1조원이 배정되었다. 신규 투자는 소규모 공사나 이미 진행 중 공사에 추가 배정될 계획이다. 국민과 정치권은 산업체의 위기설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상당수 업체가 파산 신고 혹은 부도에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신규 진입 업체 수가 이탈하는 수 감소를 가린 탓으로 추정된다.
시장이나 산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건설투자 확대와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단골 메뉴였다. 산업체가 앞서서 스스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이 없었다. 예산이 늘어날 때마다 안전사고와 품질 하자를 줄이겠다는 약속이 반복되었지만 공사현장의 사망자수는 최근 3년간 줄어들지 않았다. 주택시장에 부실시공 논란이 기획 소송으로 끊임없이 제기된다. 언제까지 정부 예산과 정책에 의지해야 하는가? 산업체 스스로 위기 극복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기대할 수 없는가? 건설산업이 주력하는 국토 인프라 시장은 소멸되지 않는 안정된 시장이다. 2025년 글로벌 건설투자 시장을 약 15.6조달러로 국제전망기관들이 예측했다. 시장은 있는데 기술 기반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정부의 건설기술 정책이 탈 건설 현장(osc), 현장의 제조업화, 모듈과 사전조립, 원격제어, 로봇 사용 확대, 설계자동화 등이 동원된 스마트 건설로 향하고 있다. 산업체도 정부 기술 정책 방향성에 동의하는 편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이 한국건설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 기술이 될 수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이지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 기술이 아니다. 브랜드 건설기술은 국가가 아닌 개별 산업체의 몫이다. 브랜드 기술이란 독창성과 고유성, 경쟁사보다 더 값싸고 더 빠르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함을 홍보하는 기업의 마켓팅 전략 기술이다. 한국건설의 브랜드 기술 이슈를 짚어보자.
설계엔지니어링의 브랜드 기술은 사업 타당성 분석이나 예비설계 단계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흔히 얘기하는 ‘FEED, front end engineering & design’ 기술이다. FEED는 발주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투자비와 공기, 성능 등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패키지로 구성된다. 시뮬레이션은 발주자 요구, 위치, 환경, 주문 자재, 자국화 등 입력 조건 변화에 따라 그 즉시 해답을 줄 수 있는 데이터 기반 SW(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기본설계나 상세설계는 AI와 BIM,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생산기술이 평준화되어 브랜드화 가치가 없다. 기술보다 가격이 경쟁의 주요 요소다. 시공 브랜드 기술은 가설 자재와 장비, 그리고 시공설계 및 운용 기술이다. 엔지니어링 브랜드가 SW 기술 중심이라면 시공은 SW와 HW(하드웨어) 기술 일체형이다.
글로벌에서 기술 브랜드 보유는 발주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브랜드는 가격보다 총투자비와 공기 저감에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술이 더 중시된다. 국내 엔지니어링사가 브랜드 기술을 갖추는 데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FEED에 해당하는 기술이 발주자 영역이기 때문이다. 시공 브랜드 기술은 공공공사에 생존하기 힘들다. 원가산정 방식과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상태와 가성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입찰방식 때문이다. 한 개의 브랜드 기술로 다수 프로젝트에 활용이 가능해야 하는 데 공공공사의 변별력 없는 획일적 발주, 입ㆍ낙찰, 계약 등 발주 사이클 전체가 걸림돌이다. 한국건설을 살리는 길은 브랜드 기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데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계약제도의 고도화다. 정책 혁신과 산업생태계 재편이 절실하다.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