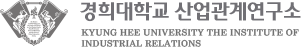[법률라운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가능 범위에 대한 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5-10-16 13:05본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와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는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하며(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서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그런데 이러한 법리가 언제나 합당한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정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 등 절차로 나아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된 하도급금액이 발주자의 직접지급 가능 범위에서 공제되는 결과, 수급사업자로서는 발주자로부터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직접지급사유로 규정함으로써(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경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한 당초 직접지급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아 부당하다(위 대법원 2011다2029 판결 사안의 항소심 판결 취지 참조). 게다가 원사업자는 잔여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수급사업자들에 우선하여 지급받음과 동시에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하는 이익을 얻는 반면, 수급사업자들은 원사업자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과 아울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도 형해화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현저히 불합리하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38847 판결).
결국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직접지급제도의 입법 취지 및 실효성을 고려하면, 직접지급 가능범위 산정 시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된 하도급대금을 단순 공제할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원사업자의 전체 미지급 공사대금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모두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지급 가능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석아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 이전글[법률라운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는 이자의 성질 및 적용 이율 25.10.21
- 다음글[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감정 25.10.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